‘읽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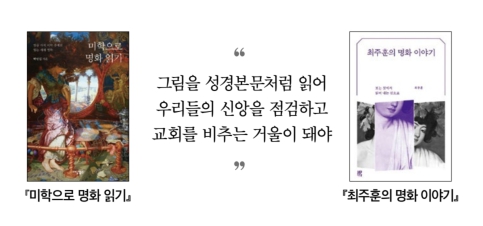
이번에 소개하는 일반 서적은 박연실 교수의 『미학으로 명화 읽기』이고, 신앙 서적은 최주훈 목사의 『최주훈의 명화 이야기』입니다.
일반 서적 『미학으로 명화 읽기』는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할 때 흥미 위주의 감상을 뛰어넘어 작품을 좀 더 진지하게 감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도움닫기 발판이 필요한데 고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의 조지 디키에 이르기까지 일곱 가지 미학 이론을 통해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해야 하는지를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으로서 예술’, 톨스토이 콜링우드의 ‘표현론으로서 예술’, 데카르트 마 리프 뜨개 신고전주의의 ‘합리론으로서 예술’을 비롯하여, 버크 흄의 ‘취미론으로서 예술’, 칸트 헤겔 그린버그의 ‘형식론으로서 예술’, 비트겐슈타인 아서 단토 모리스 와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 디키 노엘 케롤의 제도론으로서 예술을 설명합니다.
저자는 책 제목처럼 미학을 통해 명화를 단순히 눈으로 ‘보는’ 차원을 넘어, 그림의 본질과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읽는’ 차원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명화를 분석하고 감상하게 하는 다양한 미학적 관점을 접하므로, 자신만의 해석 방법을 통해 명화 속에 담긴 작가의 세계관, 작가가 살던 사회와 정치 경제적 맥락을 읽어낼 것을 도전합니다.
신앙 서적 『최주훈의 명화 이야기』는 박연실 교수의 『미학으로 명화 읽기』의 실제편입니다. 명화를 볼 때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학이라는 도움닫기 발판을 활용해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그림을 잘 읽어내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2001년 리자 스미스와 제프리 스미스 교수의 연구 보고서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놓았습니다. 명화를 보기 위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 150명은 과연 6개의 명화를 보기 위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17초! 관람객이 한 작품당 머문 시간의 평균 시간이 17초였습니다.
저자는 그림을 ‘보는 것’에서 ‘읽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상 (iconography)’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도상이란 그림에 담긴 상징을 읽어내는 작업입니다. 종교화를 감상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림에 담긴 요소들을 읽어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중략) …중세 서양미술은 교회 역사와 연결되어 있으니, 교회사와 교의학자라면 미술사학자와 다른 관점에서 독특한 이야기보따리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P.8).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미술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미술사학자도 아닌 저자의 기독교 관련 명화를 소개할 때 ‘보는’ 그림을 넘어 ‘읽는’ 그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이자 신학자인 저자의 그림에 담긴 도상을 따라 함께 읽어갈 때 ‘목사가 보는 그림’을 이해하게 되고 ‘신학자가 그림을 통해 관할하는 시대상’이 어떤지 엿볼 수 있어서 예언자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저같은 목사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 책을 목회자들의 독서 모임 ‘책삶’(책읽는삶)에서 저자 직강으로 만났습니다.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왜 명화를 읽어내는 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고 책 목차를 보면서 그림 설명에 따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교로 작성해야겠다는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책삶’에서 자체 발제를 했던 한마음교회 조민호 목사의 결론 부분으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최주훈의 명화 이야기』는 예술과 신앙의 만남을 통해 복음의 깊이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중략) …이 책은 단순히 미술사 해설서가 아니라 그림 한 장을 성경 본문처럼 읽어내는 가운데,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의 교회(우리 자신)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을 통해, 단순히 명화를 감상하고 소개받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더욱 깊이 있게 성찰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