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개혁주일의 참 정신은 ‘인물’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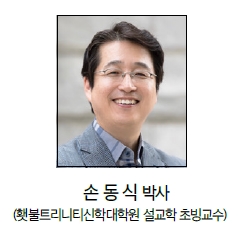
종교개혁기념주일이 다가왔다. 우리가 잊혀져가는 마틴 루터의 그 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날이 개신교가 태동된 날인 까닭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관습이, 우리의 신앙이 유일한 권위인 성경 앞에 굴복된 날이며, 오늘날 교회라고 불리는 개신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한 날이기 때문이다.
종교개혁기념 주일은 문자 그대로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로 그 역사적 사건을 지나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의미있는 역사적 사건이라 해도 익숙해지면 시시해지기 마련이다. 마치 중요한 국경일이 원래의 의도와 달리 그저 공휴일로 인식되는 세태처럼 말이다.
따라서, 이 의미있는 날을 기념하고 그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교개혁의 사건을 ‘낯설게 들려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낯설 때 그것은 새롭고 흥미로우며, 생각의 지평을 확장시켜 선한 용기와 행동을 위한 기반이 되어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주일의 메시지를 어떻게 낯설게 들려줄 수 있을까?
마틴 루터의 커튼 뒤로 시선을 돌리라 대부분의 교인들은 ‘종교개혁’ 하면 마틴 루터(M. Luther, 1483~1546)라는 이름 외에는 거의 떠올리지 못한다. 이는 매년 종교개혁주일이면 비텐베르크에 95개 반박문을 내건 루터의 이야기가 강단의 단골메뉴인 까닭이다.
그러나 낯설게 전하기 위해서는 루터에게만 단편적으로 비치던 조명을 보다 다양한 지점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곧 개혁자 루터가 아니라 루터 시대를 둘러싸고 있던 다양한 사회적, 종교적 정황과 긴장을 심도 깊게 스토리텔링으로 나눔으로 오늘을 위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말로만 듣던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자세히 다룸으로 설교를 구성할 수 있다. 루터의 반박문은 부당한 교황권과 면죄부에 관해 주로 다룬다.
그러나 62조, 94조, 95조는 현대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제자도에 관한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다. 루터와 관련하여, 한 발 더 나간다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저서라 일컫는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고함」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내용을 성경과 연관하여 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루터와 종교개혁의 쌍두마차를 이루었던 루터의 동료요, 친구였던 멜란히톤(P. Melanchthon, 1497~1560)의 동역과 우정에 관해서도 나눌 수 있다.
멜란히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바로 다음해, 비텐베르크 대학의 희랍어 교수로 부임하여 루터의 성경번역과 종교개혁을 도왔다.
멜란히톤은 ⌈신학총론」(Loci Communes, 1521)과 최초의 개신교 신앙고백서라 할 수 있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Confessio Augustan, 1530)을 저술함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집대성했다.
조금 더 조명을 크게 옮겨 스위스 취리히로 가보자. 우리는 그곳에서 루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츠빙글리(U. Zwingli, 1484~1531)의 종교개혁을 소개할 수 있다.
소위 ‘소시지 사건’이 발단이 된 취리히의 종교개혁은 츠빙글리가 67개 개혁 조항을 취리히 시의회에 제출함으로 시작되었다.
시의회의 수용으로 종교개혁의 물결은 베른, 바젤, 샤프하우젠, 제네바로 옮겨져 스위스의 절반이 개혁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 뿐인가. 존 칼빈(J. Calvin, 1509-1564)은 그들의 유산을 이어 바젤에서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 저술과 제네바에서 제네바 아카데미(Geneva Academy)의 설립을 통해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숨겨진 영웅들에게 시선을 돌리라 우리는 루터가 존재했던 앞뒤 세대의 영웅들에게 주목함으로 개혁주일 설교를 위한 장작과 땔감을 구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지만, 그의 종교개혁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루터보다 100여 년 전, 영국 옥스포드의 신학자 존 위클리프(J. Wycliffe, 1320s~1384)는 진리의 근원은 교황이나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성경임을 천명하며, 1382년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함으로 종교개혁의 기초를 놓았다.
또한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체코의 얀 후스(J. Hus, 1369~1415)는 성경을 교회의 유일한 권위로 주장하며 고위 성직자들의 세속화와 탐욕을 비판하다 1414년 콘스탄츠 공회에 소환되어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 화형에 처해졌다.
또한 칼빈의 종교개혁 후, 프랑스에서는 개혁 교리를 따르는 개신교도인 위그노(Huguenot)들이 무자비한 박해를 받았다.
그들은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 혀가 잘린 채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화형 당했다.
또한 옥스포드 대학 거리 바닥 위에 돌 십자가 표식으로 순교지가 새겨진 영국 종교개혁의 지도자요, 주교요, 동료였던 토마스 크랜머(T. Cranmer, 1489~1556), 니콜라스 리들리(N. Ridley, 1500-1555), 휴 래티머(H. Latimer, 1487~1555)를 소개할 수 있다.
그들은 권력의 고문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충성하기 위해 고통스런 화형을 선택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순교자들은 이렇게 외쳤다.
“용기를 갖고 사내답게 행동합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을 영국에 붙일 것이오… 하나님을 위해 불길이여, 내게로 오라!”
또한 존 녹스(J. Knox)로 유명한 스코틀랜드에는 패트릭 해밀턴(1504~1528), 제롬 러셀(J. Russell), 알렉산더 케네디(A. Kennedy)가 진리를 위해 순교했으며, 존 녹스의 스승인 조지 위샤트(G. Wishart, 1512~1546)는 장엄한 북해(北海)가 보이는 세인트앤드류의 불길 속에 몸을 던졌다.
이들을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숙연한 순교 이야기는 코로나로 인해 메말라가고 해이해져 가는 교회의 신앙에 새로운 열정의 불을 위한 뜨거운 석탄이 될 수도 있다.
성경으로 시선을 고정하라 그러나 종교개혁주일의 참 정신은 인물에 있지 않고 성경에 있다. 곧 모든 종교개혁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에는 언제나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 있었다.
모든 개혁은 성경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성경을 번역하는 것과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완성되었다. 따라서 어떤 종교개혁자의 생애를 다룰지라도 우리는 하나의 올바른 성경적 결론, 곧 교회와 신앙의 유일한 권위인 성경으로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성경적 결론은 교회의 참된 능력과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변한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세상과 교회의 가장 긴급한 필요는 참된 설교”라는 마틴 로이드 존스(M. Lloyd-Jones)의 말은 정당하다.
아울러 제언하기는 종교개혁주일 같이 특별하고 역사적인 주일은 강단을 위해 교단 차원이나 혹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두 세 편의 잘 짜여진 설교문과 이를 위한 특별 자료를 공급해도 좋을 것이다.
교단에 속해 있는 수천 개의 교회가 짧은 시간, 제각각 설교를 준비하기보다 교회사 전문가들을 통해 이와 관련된 설교 원고와 PPT 자료, 마틴 루터나 최근에 제작된 츠빙글리와 관련된 영화를 30분 정도로 편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면 개교회 설교자의 설교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더욱 전문적이며 풍성한 주일 강단이 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기본 얼개는 그것으로 하고 개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점을 달리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주일, 교단의 전 강단에서 하나의 일치된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그것 또한 뜻깊을 것이다.
이 몸을 바치옵니다 오직 양심이 이끄는 대로 진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던졌던 수많은 개혁자들의 삶과 죽음은 이제 책 속의 옛이야기가 되었다.
개혁이란 위대한 용어이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그것은 시대의 중력을 거스리는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피로 얼룩진 그들이 번역한 성경과 목숨으로 쟁취한 진리의 유산을 넘겨받았다.
프로테스탄트의 후예인 우리 설교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며 산화(散花)했던 그들의 뜨거운 가슴일지 모른다. 하나님께 영광.

